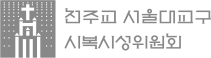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 탄생에서 사제 수품까지
바르텔레미 브뤼기에르(Barthélémy Bruguière, 蘇 바르톨로메오) 주교는 1792년 2월 12일 프랑스 카르카손(Carcassonne)교구의 나르본(Narbonne) 근교 레삭도드(Raissac d'Aude) 마을에서, 자작농인 프랑수아 브뤼기에르(François Bruguière)와 테레즈 브뤼기에르(Thérèse Bruguière)의 열한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훗날에 택한 한자 성(姓)은 '소(蘇)'였다.
1805년 13세의 나이로 카르카손 소신학교에 입학한 브뤼기에르는 성적이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심이 두텁고 대담 솔직하여 스승들의 인정을 받았다. 소신학교를 마치고 카르카손 대신학교에 진학하여 1814년 3월 26일 차부제품을 받았으며, 이후 소신학교 3학년 교사로 임명되어 5년간 가르쳤다. 1815년 12월 23일 사제로 서품된 그는 1819년부터는 대신학교 교수로 임명되어 6년간 재직하였다.
◇ 시암대목구 사목
브뤼기에르 신부는 카르카손 대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외방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그는 1825년 9월 17일 33세의 나이로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하여 4개월 반 동안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마쳤다. 그런 다음 이듬해 2월 26일 보르도 항구를 출발하여 아시아 선교 활동의 거점인 동 전교회의 마카오 대표부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시암(Siam)대목구 선교사로 임명되어 1827년 6월 3일 시암의 수도 방콕(Bangkok)에 도착하였다.
브뤼기에르 신부가 방콕에서 처음 맡은 일은 그곳 신학교의 교수였다. 또 시암어에 익숙해진 뒤에는 일선 사목을 겸하였고, 교구청 사무도 담당하였다. 당시의 상황에서 이처럼 여러 직무를 겸임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였다.
당시 시암대목구장은 에스프리 플로랑(Esprit M.J. Florens, 1762~1834) 주교로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 연로한 편이었다. 그는 브뤼기에르 신부가 시암대목구에서 활동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를 부주교로 임명하기 위해 교황청에 청원서를 올렸다.
◇ 조선 선교 자임과 주교 수품
그 무렵 교황청에서는 조선 선교지를 북경교구에서 분리하여 대목구로 설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포교성성 장관 카펠라리(B.A. Cappellari, 1765~1846) 추기경이 1827년 9월 1일과 11월 17일,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의 랑글루아(C.F. Langlois, 1767~1851) 교장 신부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문의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리외방전교회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데다가 조선 입국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브뤼기에르 신부는 카르카손 대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미 《전교회지》를 통해 조선 선교지가 처한 상황과 조선 신자들의 희망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 교우들을 도우러 가고 싶은 열망을 여러 차례 품은 적도 있었다.[1] 그러던 중에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서 아시아 선교사들에게 보낸 1828년 1월 6일 자 공개서한을 통해 동 전교회 본부가 조선 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829년 5월 19일, 브뤼기에르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서한을 보내 조선 선교지와 조선 신자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조선 선교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브뤼기에르 신부는 1829년과 1830년에 거듭 포교성성 장관에게도 서한을 보내 조선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설명하면서 허락을 간청하였다. 또 이러한 결심을 플로랑 주교에게도 설명하였고, 그의 열정에 감동한 플로랑 주교는 1829년에 '브뤼기에르 신부를 조선으로 보내는 데 동의한다.'는 서한을 포교성성으로 보냈다.
한편 플로랑 주교는 1828년에 '브뤼기에르 신부를 시암대목구장 계승권을 지닌 갑사(Capsa) 명의의 부주교로 임명한다.'는 교황 칙서를 받았다. 브뤼기에르 신부도 조선으로 가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주교 임명을 수락하고, 1829년 6월 29일 방콕에서 주교로 서품되었다. 그런 다음 페낭(Penang)섬에 있는 신학교로 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였다.
◇ 조선대목구장 임명과 조선을 향한 첫걸음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재위 1831~1846)는 조선대목구를 신설함과 동시에 브뤼기에르 주교를 초대 대목구장에 임명하였다. 7개월 전에 교황으로 선출된 포교성성 장관 카펠라리 추기경이 바로 그레고리오 16세였다.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대목구장에 임명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832년 7월 25일 뒤브와(J. Dubois, 1766~1848) 신부의 서한을 통해서였다. 이에 그는 조선으로 가기 위해 시암대목구의 신임 선교사 클레망소(Pierre Clémenceau) 신부, 페낭 신학교를 중퇴한 중국인 신자 왕(王) 요셉 등과 함께 1832년 8월 4일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때 페낭 신학교의 샤스탕(J.H. Chastan, 鄭牙各伯, 1803~1839) 신부가 브뤼기에르 주교를 따라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주교는 이를 수락하는 대신 훗날을 기약하였다.
당시 싱가포르 선교지는 시암대목구장의 재치권을 거부하는 포르투갈 선교사들로 인해 분쟁이 일고 있었는데, 브뤼기에르 주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클레망소 신부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마카오로 출발해야만 하였다.
1832년 10월 18일 마카오에 도착한 브뤼기에르 주교는 포교성성의 마카오 대표부를 방문하여 움피에레스(R. Umpierres) 신부를 만났다. 그리고 11월 21일 조선대목구 설정 칙서와 대목구장 임명 칙서를 수령하였다.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대목구장으로서 처음 한 일은 두 가지였다. 먼저 조선 선교지에 대한 재치권을 행사해 온 전임자, 즉 북경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던 남경교구장 피레스 페레이라(C. Pires-Pereira, 畢學源, 1769~1838) 주교에게 조선대목구 설정과 대목구장 임명 사실을 알리는 서한을 작성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조선 신자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사목 서한도 작성하였다. 브뤼기에르 주교는 이 서한들을 왕 요셉에게 주어 북경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마카오에 머무를 당시 브뤼기에르 주교는 자신의 발걸음을 막으려는 몇몇 시도들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이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그는 갖가지 추측과 만류에도 놀라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럼,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 보아야지요.”
“알려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길을 하나 만들어야지요.”
“아무도 주교님과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두고 봐야지요.”[3]
◇ 복건에서 남경으로
1832년 12월 19일, 브뤼기에르 주교는 복건(福建)대목구장 카르페나 디아스(R.J. Carpegna Díaz, 羅羅各, 1760~1845) 주교가 보낸 배에 승선하였다. 조선으로 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을 남에서 북으로 종단하는 여정에 오른 것이다. 당시 그 배에는 중국의 각 선교지로 떠나는 모방(P.P. Maubant, 羅伯多綠, 1803-1839) 신부 등 5명의 선교사들이 동승하였다. 목적지는 복건대목구장이 있던 복안(福安)의 정두촌(頂頭村)[4]이었고, 그들 일행은 1833년 3월 1일 그곳에 도착하였다.
8일 뒤인 1833년 3월 9일, 모방 신부는 자신의 임지인 사천(四川)대목구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선 선교를 자원하였다. 이에 브뤼기에르 주교는 일단 모방 신부의 의향을 담은 서한을 사천대목구장 폰타나(G.L. Fontana, 1780~1838) 주교에게 보내는 한편, 모방 신부가 당분간 복건의 흥화(興化) 지역에서 사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폰타나 주교가 모방 신부의 조선 선교를 허락한 것은 다음해 8월이었다.
4월 27일 브뤼기에르 주교는 남경을 향한 항해에 올랐고, 5월 중순 무렵 남경 근처에 도착하여 남경교구의 총대리 카스트로(Castro) 신부를 만났다. 이때 브뤼기에르 주교는 그에게 안내인을 소개해 주도록 부탁하였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는 없었다.
한편 왕 요셉은 1833년 2월 17일 북경에 도착하여 브뤼기에르 주교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그런 다음 피레스 페레이라 주교의 지시에 따라 조선으로 가는 중국인 여항덕(余恒德) 파치피코(1795~1854) 신부를 요동으로 안내하였고, 그곳에서 브뤼기에르 주교가 거처할 곳을 물색한 뒤 6월 26일 주교가 있는 남경 근처에 도착하였다. 이후 브뤼기에르 주교는 왕 요셉의 주선과 피레스 페레이라 주교의 서한 덕택에 자신을 안내해 줄 도 바오로 노인과 양 요한을 만날 수 있었다.
◇ 병고를 극복하고 산서 주교관에 머물다
1833년 7월 20일, 브뤼기에르 주교는 왕 요셉과 두 명의 안내인을 동행자로 삼아 북쪽으로 출발하였다. 목적지는 조선 교회의 밀사들을 만날 수 있는 북경이었다. 그들 일행은 며칠을 여행한 뒤 배를 타고 운하와 양자강을 건너 7월 31일 북쪽 강변에 하선하였다. 이때 브뤼기에르 주교는 남경 근처에 있을 때부터 앓기 시작한 열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여정은 계속되었다. 절강성(浙江省)에서부터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평원지대를 가로질러 통과한 브뤼기에르 주교는 8월 13일 황하를 건넜다. 그는 여전히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때로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서 하루나 이틀을 앓아눕곤 하였다. 그런 몸으로 안내인들에게 이끌려 여정을 계속하던 브뤼기에르 주교는 산동성(山東省)을 거쳐 북경에서 멀지 않은 직예(直隷) 지역에 도착하여 한 교우 집에 머물러야만 하였다. 그때가 8월 26일이었다.
브뤼기에르 주교는 1개월 정도 앓아누운 뒤에야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는 일단 왕 요셉을 북경으로 보내고, 9월 29일에는 살베티(J. Salvetti, 1769~1843) 주교가 사목하고 있던 산서(山西)로 출발하였다. 당시 살베티 주교의 거처는 태원(太原)의 구급촌(九汲村)[5]에 있었다.
1833년 10월 10일 산서 주교관에 도착한 브뤼기에르 주교는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약 1년 정도 그곳에 머물렀다. 이 기간에 그는 조선 신자들이 보낸 서한 두 통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안에는 주교의 조선 입국을 만류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왕 요셉을 다시 북경으로 보내 조선 교회의 밀사들을 만나고, 조선 교회의 상황에 대해 알아오도록 하였다.
한편 일찍이 조선 선교를 자원하였던 샤스탕 신부는 1833년 5월 시암대목구장 플로랑 주교의 승낙을 얻어 페낭을 출발하였고, 마카오를 거쳐 복건으로 가서 모방 신부와 합류하였다. 이들은 1833년 12월 4일 복건을 출발하여 각각 다른 경로로 북상하였다. 우선 모방 신부는 육로를 택하여 북경으로 갔고, 1834년 6월 8일에는 만리장성 근처에 있는 장가구(張家口)의 서만자(西灣子)[6]교우촌에 도착하였다. 해로를 통해 상해로 갔던 샤스탕 신부는 계속 북상하여 요동과 북경까지 갔다가 산동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였다.
◇ 서만자 교우촌에서 확인한 조선 신자들의 서한
1834년 9월 22일 브뤼기에르 주교는 살베티 주교에게 작별을 고하고 라자로회 선교사들의 사목 지역인 서만자 교우촌으로 향하였다. 북경과 가까운 이곳이 조선 신자들과 연락하는데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10월 8일 서만자에 도착한 브뤼기에르 주교는 먼저 이곳에 와 있던 모방 신부와 만났다. 또 다음해 1월 9일에는 왕 요셉을 다시 북경으로 보냈다.
1835년 1월 19일, 왕 요셉은 북경에 온 조선 교회의 밀사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브뤼기에르 주교의 명에 따라 조선 교회의 상황을 묻고 주교의 서한을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브뤼기에르 주교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밀사 유진길(劉進吉 아우구스티노, 1791~1839), 조신철(趙信喆 가롤로, 1796~1839), 김 프란치스코는 '오는 연말에 주교님을 반드시 조선으로 모시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835년 1월 21일(음력 1834년 12월 23일) 자 서한을 주교에게 전해주도록 하였다. 왕 요셉은 이 서한을 가지고 1월 26일 서만자로 귀환하였다가 3일 뒤 다시 북경으로 가서 다시 조선의 밀사들을 만났다.
서만자에 머무는 동안 브뤼기에르 주교는 몇 차례 박해의 위험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 와중에도 그의 생각은 언제나 조선으로 향해 있었고, 특히 왕 요셉이 가져온 조선 신자들의 서한을 받고 나서는 그 내용에 고무되어 망설임 없이 출발을 결정하였다.
브뤼기에르 주교는 서만자를 떠나기 전에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자신이 조선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방 신부가 자신의 뒤를 이어 조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조선과 접해 있는 요동 지방을 북경교구에서 분리하여 조선대목구장의 관리 아래 두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로마에 발송하였다.[8] 요동 지방은 중국 대륙을 종단한 선교사가 조선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 브뤼기에르 주교의 선종과 조선 이장
문제는 브뤼기에르 주교의 건강이었다. 수종병(水腫病)에 걸린 데다가 심한 두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조선에 입국하지 못하고 변방인 달단(韃靼) 지방에서 죽을 것[9]이라는 생각까지 하였다. 모방 신부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조선으로 가도록 조치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조선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 아래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10월 7일. 브뤼기에르 주교는 두통이 잠시 가라앉자마자 서만자를 떠났다. 목적지는 조선 교회의 밀사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국경 마을 변문(邊門)[10]이었고, 동행자는 중국인 라자리스트 곽 신부와 왕 요셉이었다. 브뤼기에르 주교는 12월 말 이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통이 도진 데다가 혹한으로 병이 악화되어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만 하였다. 그는 이러한 몸으로 열이틀 후인 10월 19일, 내몽골의 작은 교우촌 마가자(馬架子)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보름 동안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길을 나설 예정이었다.
마가자에 도착한 이튿날은 평온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브뤼기에르 주교의 병은 호전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책도 읽고 곽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며,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는 잠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고, 신자 면도사의 도움으로 면도도 마쳤다. 이어 중국식으로 머리카락을 다듬는 조발을 마무리하는 순간, 브뤼기에르 주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침상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예수, 마리아, 요셉'을 부르면서 의식을 잃었다. 중국인 곽 신부는 급히 병자성사를 베풀고, 임종을 돕는 기도를 바쳤다. 그때가 10월 20일 저녁 8시 15분경으로, 주교의 나이 43세였다.
서만자에 있던 모방 신부가 브뤼기에르 주교의 선종 소식을 접한 것은 11월 1일이었다. 이에 그는 마카오와 로마로 서한을 보내고 나서 즉시 마가자로 출발하여 17일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런 다음 21일 신자들과 함께 장례 미사를 봉헌하고 주교의 시신을 신자들의 묘지에 안장하였다. 모방 신부는 브뤼기에르 주교의 사망 원인을 광활한 중국 대륙을 북상하면서 겪은 궁핍과 피로와 온갖 고통[11]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모방 신부는 변문에서 조선 교회의 밀사들을 만나 1836년 1월 13일 조선에 입국하였다. 그리고 브뤼기에르 주교의 유해는 조선대목구 설정 100주년이 되는 1931년에 마가자 현지에서 발굴되어 조선으로 옮겨졌으며, 10월 15일 서울 용산에 있는 성직자 묘역에 안치되었다.
서만자에 있을 때 브뤼기에르 주교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모방 신부는 훗날 주교의 신심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여기에는 조선 입국에 대한 주교의 간절한 열망도 함께 들어 있었다.
- [1]<브뤼기에르 신부가 카르카손 교구 총대리 드 귀알리(F.M.E. de Gualy) 신부에게 보낸 1826년말~1827 년 초 서한>, 정양모·윤종국 신부 옮김,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가톨릭출판사, 2007, 84면.
- [2]<브뤼기에르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본부 지도자 신부들에게 보낸 1829년 5월 19일 자 서한>,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133~134면.
- [3]《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31면.
- [4]정두촌: 현 영덕시(寧德市) 복안시
- [5]구급촌: 현 태원시 진중시(晉中市) 기현(祁縣)
- [6]서만자: 현 하북성(河北省) 장가구시 숭례구(崇禮區)
- [7]《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365면.
- [8]<브뤼기에르 주교가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1835년 10월 1일 자 서한> 및 <브뤼기에르 주교가 르그레즈와(P.L. Legrégeois) 신부에게 보낸 1835년 10월 6일 자 서한>,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46·354면. 르그레즈와(1801~1866): 파리외방전교회 마카오 대표부의 대표 신부.
- [9]<알퐁소 데 도나토(A.M. De Donato)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총장 랑글루아 신부에게 보낸 1835년 10월 서한>,《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60면. 도나토(1783~1848): 1831년 9월에 호광(湖廣)·산서(山 西)·섬서(陝西)대목구의 보좌 주교로 임명되었고, 1843년 9월 21일 산서대목구장을 승계하였다.
- [10] 변문: 현 요녕성(遼寧省) 봉성시(鳳城市) 변문진; 마가자: 일명 펠리구(別拉溝). 현 적봉시(赤峰市) 송산구(松山區) 동산향(東山鄕)
- [11]<모방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와 파리외방전교회 본부 신부들에게 보낸 1835년 11월 9일 자 서한>,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61면.
- [12]위의 서한,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362면.